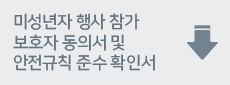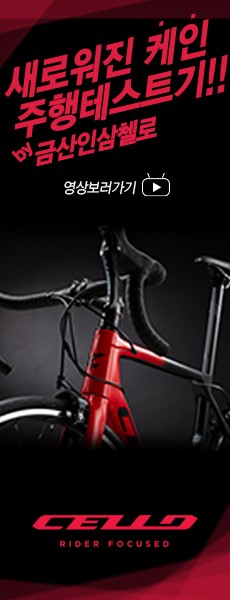익산 미륵사지 메디아폰도를 다녀와서
무주 메디오폰도를 치르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아침이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리는 메디오폰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문득 2017년 3월, 가족과 함께 떠났던 ‘백제의 고도를 찾아서’ 여행이 되살아났다.
공주의 공산성 아래에서 느꼈던 고즈넉한 바람,
부여 낙화암에서 바라본 강물의 슬픔,
왕궁리 유적의 단단한 흙 냄새,
그리고 해체되어 번호표를 단 채
노천에 그대로 드러나 있던 미륵사지 석탑의 충격적인 모습까지—모든 풍경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의 여운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 땅으로 향했다.
새벽 3시 30분,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섰다.
북수원IC를 지나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때 한 나라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난 백제의 흔적들이
도로 옆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을 흔드는 듯했다.
6시 30분, 미륵사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새벽빛을 품고 있었다.
라이딩 출발 전, 자전거를 타고 사찰터를 한 바퀴 돌았다.
미륵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다.
무왕이 왕권을 세우고 미래를 건 꿈,
왕비가 함께 발원한 미륵의 세계,
백제가 다시 일어서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었다.
일반 사찰의 1탑 1금당과 달리
이곳이 3탑 3금당 구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야망과 세계관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웅대한 건물들은 전쟁의 시간에 거의 사라졌지만
탑터와 기단, 회랑의 잔해만으로도
‘이곳은 한때 큰 나라였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렬했다.
오늘 달릴 거리는 95.7km, 상승고도 609m.
숫자만 보면 평범하지만
백제의 들판은 숫자를 넘어서는 리듬을 품고 있었다.
익산의 들판은 놀랍도록 넓고, 놀랍도록 고요하다.
바람은 볏짚 냄새와 땅 냄새를 함께 실어 보냈다.
멀리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사이로
늦가을의 햇살이 대지를 은은하게 덮었다.
그 풍경 앞에서 나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다에서 길을 끊어 호남을 지켜낸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익산을 직접 지킨 적은 없다.
그의 싸움터는 여수와 한산도, 진도 앞바다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광활한 들판 역시
결국 그의 결단이 지켜낸 땅이었다.
왜냐하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부산과 남해를 통해
호남의 곡식과 군량을 실어 올려
한양까지 진군하려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다를 닫아버렸다.
한산도의 바람 아래 수십 척의 왜선을 태웠고,
명량의 거센 물살에서 단 12척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가 바다를 지켰기에
전라도의 곡식은 일본군의 배에 실리지 않았고,
익산까지 이어지는 이 평야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 사실을 떠올리자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이 울렸다.
지금의 이 고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누군가의 피와 결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라이딩은 단순한 기록이 될 수 없었다.
혹시 장군이 백의종군하던 시절,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여산의 고갯길을 지났을까.
억울함을 품은 채, 그러나 결심을 굳힌 발걸음으로
이와 비슷한 들판을 바라보았을까.
길은 흙에서 시멘트로,
시멘트에서 아스팔트가 되었지만
길 자체는 그때와 다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페달을 돌리며 들판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군량을 지켜낸 땅,
누군가의 결단이 흘러들어와 묵직하게 누워 있는 땅.
그 바람 속에서
어딘가 멀리서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길을 끊어야, 나라가 산다.”
익산의 바람은 오래된 역사를 품고 지나갔다.
그 바람을 따라 페달을 다시 밟자
어느 순간 오늘의 작은 라이딩이
역사의 한 조각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찾아왔다.
97km의 길이 끝났을 때,
나는 단순히 한 코스를 완주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을 지나온 듯한
묵직한 여운을 얻고 있었다.
함께 달려준 흑마 잉규님과 따거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끝내 즐거웠고,
그대들이 만들어준 KTX급 무틉 열차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야성의 질주 본능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아주신 굼디사진 작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늘 큰 힘을 얻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리는 메디오폰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문득 2017년 3월, 가족과 함께 떠났던 ‘백제의 고도를 찾아서’ 여행이 되살아났다.
공주의 공산성 아래에서 느꼈던 고즈넉한 바람,
부여 낙화암에서 바라본 강물의 슬픔,
왕궁리 유적의 단단한 흙 냄새,
그리고 해체되어 번호표를 단 채
노천에 그대로 드러나 있던 미륵사지 석탑의 충격적인 모습까지—모든 풍경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의 여운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 땅으로 향했다.
새벽 3시 30분,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섰다.
북수원IC를 지나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때 한 나라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난 백제의 흔적들이
도로 옆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을 흔드는 듯했다.
6시 30분, 미륵사지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새벽빛을 품고 있었다.
라이딩 출발 전, 자전거를 타고 사찰터를 한 바퀴 돌았다.
미륵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다.
무왕이 왕권을 세우고 미래를 건 꿈,
왕비가 함께 발원한 미륵의 세계,
백제가 다시 일어서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의 선언이었다.
일반 사찰의 1탑 1금당과 달리
이곳이 3탑 3금당 구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야망과 세계관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웅대한 건물들은 전쟁의 시간에 거의 사라졌지만
탑터와 기단, 회랑의 잔해만으로도
‘이곳은 한때 큰 나라였다’는 메시지는 여전히 강렬했다.
오늘 달릴 거리는 95.7km, 상승고도 609m.
숫자만 보면 평범하지만
백제의 들판은 숫자를 넘어서는 리듬을 품고 있었다.
익산의 들판은 놀랍도록 넓고, 놀랍도록 고요하다.
바람은 볏짚 냄새와 땅 냄새를 함께 실어 보냈다.
멀리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사이로
늦가을의 햇살이 대지를 은은하게 덮었다.
그 풍경 앞에서 나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다에서 길을 끊어 호남을 지켜낸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익산을 직접 지킨 적은 없다.
그의 싸움터는 여수와 한산도, 진도 앞바다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광활한 들판 역시
결국 그의 결단이 지켜낸 땅이었다.
왜냐하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부산과 남해를 통해
호남의 곡식과 군량을 실어 올려
한양까지 진군하려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바다를 닫아버렸다.
한산도의 바람 아래 수십 척의 왜선을 태웠고,
명량의 거센 물살에서 단 12척으로 길을 만들었다.
그가 바다를 지켰기에
전라도의 곡식은 일본군의 배에 실리지 않았고,
익산까지 이어지는 이 평야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 사실을 떠올리자 마음 어딘가 깊은 곳이 울렸다.
지금의 이 고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누군가의 피와 결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라이딩은 단순한 기록이 될 수 없었다.
혹시 장군이 백의종군하던 시절,
이곳에서 멀지 않은 여산의 고갯길을 지났을까.
억울함을 품은 채, 그러나 결심을 굳힌 발걸음으로
이와 비슷한 들판을 바라보았을까.
길은 흙에서 시멘트로,
시멘트에서 아스팔트가 되었지만
길 자체는 그때와 다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페달을 돌리며 들판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군량을 지켜낸 땅,
누군가의 결단이 흘러들어와 묵직하게 누워 있는 땅.
그 바람 속에서
어딘가 멀리서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길을 끊어야, 나라가 산다.”
익산의 바람은 오래된 역사를 품고 지나갔다.
그 바람을 따라 페달을 다시 밟자
어느 순간 오늘의 작은 라이딩이
역사의 한 조각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찾아왔다.
97km의 길이 끝났을 때,
나는 단순히 한 코스를 완주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을 지나온 듯한
묵직한 여운을 얻고 있었다.
함께 달려준 흑마 잉규님과 따거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끝내 즐거웠고,
그대들이 만들어준 KTX급 무틉 열차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야성의 질주 본능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아주신 굼디사진 작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리에서 열정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늘 큰 힘을 얻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