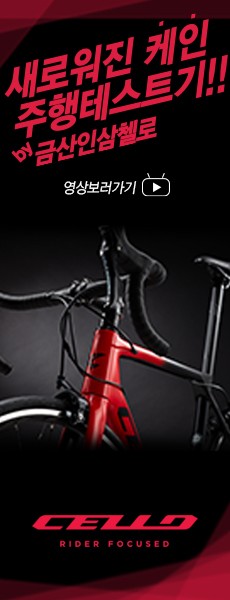[칼럼]eMTB에 대한 그 편견에 대하여
Column
eMTB에 대한 그 편견에 대하여
이제 eMTB를 일반MTB와 비교하며 폄하하는 짓은 그만하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변종이 아니다. 그냥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자전거일 뿐이다
이제 e바이크 라이딩은 큰 이슈는 아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eMTB의 열풍은 올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eMTB가 품절되었고 다시 입고되기를 기다리는 이가 많다. 물론 일반자전거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에서 라이딩을 하다보면 10그룹 중 2~3그룹은 전기자전거를 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룹이 서로 나뉘는 것은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템포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반자전거의 평속이 7~8km인 것에 비하여 전기자전거는 12~13km가 나온다. 거의 2배 가까운 속력의 차이로 같이 라이딩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월드컵 레벨의 선수와 일반 동호인이 같이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자전거인 듯 자전거 아닌
“우선 내 다리로 다니고 싶어”
아는 형님에게 전기자전거를 권했을 때 나온 말이다. 고관절 부상으로 자전거를 타기 힘들다고 하자 필자는 전기자전거를 권했다. 하지만 그 형님은 전기자전거를 휠체어와 거의 동일시 하고 있었다.
일반MTB가 eMTB를 타는 이들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부러운 시선과 경멸의 시선. 경멸의 시선이란 결국 시기와 질투도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곧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와 같은 물건으로 산에 오면 안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땀 흘려 즐거움을 보상 받으려는 것이 아닌 즐거움만 찾으려는 순수하지 못한 집단인 것이다.
부러운 시선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다. ‘이제 힘든 운동은 그만하고 즐겁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기자전거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있다. 과연 eMTB를 타면 무조건 편한 라이딩이 되는 걸까?

어떻게 탈 것이냐
얼마 전 수원에서 활동하는 라스트레이서 팀과 eMTB 그룹 라이딩을 할 기회가 있었다. 다운힐로 유명한 팀이라 업힐과는 거리가 멀거라는 생각에 부담 없이 참여했다. 슬슬 올라간 뒤 다운힐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들은 모든 템포가 빨랐다. 아주 가파른 업힐이 아니면 평속 20km를 오르내렸고, 능선에 올라서도 긴 휴식 없이 그룹이 모이면 출발하기를 반복했다. 물론 내리막에서는 그들의 장기인 다운힐 실력이 뿜어져 나왔다. 25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도 안돼서 주파했다. 일반자전거라면 두 배의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다. 심박수를 보더라도 평균 150에 최대 180을 찍었다. 만약 설렁설렁 탔다면 나오지 않을 데이터다.
트레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MTB 라이딩의 경우 심박이 급속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를 반복한다. 우리나라 산의 특성상 가파른 경사면이 많아 가끔씩 무산소에 가까운 업힐을 하고 다시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코스를 경험한다. 약간만 경사가 급해도 내려서 끌어야 하는 구간도 많다. 템포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꾸준히 알피엠을 사용하기 보다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타면 사정이 달라진다. 토크의 힘으로 가파른 경사를 타고 오를 수 있고, 남는 힘을 이용하여 내리막에서 안정된 다운힐이 가능하다. 수원 라스트레이서와의 라이딩처럼 흐름이 끊이지 않는 템포가 빠른 라이딩을 전개할 수 있다. 거의 로드바이크와 비슷한 알피엠에 기반을 둔 라이딩이 된다. 물론 산악지형이므로 장애물을 넘고 피하기 위한 전반적인 신체의 밸런스와 테크닉이 더 요구된다. 일반자전거 보다 상체의 근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이딩을 즐겁게 끝내려면 배터리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라이딩을 즐겁게 끝내려면 배터리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이 타는 것
위에서 말한 라스트레이서 팀의 경우 다들 중급자 이상의 피지컬과 테크닉을 보유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빠른 템포가 가능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동량도 적지 않았다. 순간 파워를 줄이는 대신 힘을 분산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다. 순간 근력보다는 지구력에 중점을 둔 운동이 됐다.
이 운동량은 일반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다만 eMTB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운동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3단계 4단계로 나뉘는 어시스턴트 모드가 있고, 또 페달을 밟는 라이더의 알피엠이 더해진다. 모터의 힘과 라이더의 힘 거기에 알피엠을 곱한 것이 바로 와트(파워)다.
물론 무조건 풀파워 모드로 설정하고 달린다면 힘은 적게 들겠지만 얼마 안 있어 반짝이는 배터리 경고등을 만날 것이다. 산악에서 배터리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25kg짜리 쇳덩이를 짊어지는 지옥을 만날 수 있다. 전지자전거의 태생적인 한계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는 요령과 테크닉이 바로 eMTB의 묘미 중 하나다. 경사도에 따라 모드 설정을 바꿔가며 적절히 자전거의 그립력을 확보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다. 오늘 달릴 거리에 따라 배터리 관리에 바탕한 라이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느 정도에서 에코 모드나 트레일 모드를 놓을 것인지 그리고 파워 모드는 배터리 소모가 많으므로 최소한의 구간만 사용하겠다는 플랜을 세워야한다.
 배터리 관리에 실패하면 이렇게 견인을 당할 수도...
배터리 관리에 실패하면 이렇게 견인을 당할 수도...
결론
처음 eMTB가 등장했을 때 대부분은 근력이 약해진 노약자나 부상을 당한 이에게 적합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라이딩이 늘어날수록 그런 관점은 아주 좁은 시야임이 분명해졌다. 순간 500W의 힘을 내는 라이더가 모터의 도움으로 1000W의 파워를 낸다면 분명 그 라이딩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못 오르던 곳을 오르고, 가지 않던 곳을 가게 된다. 하루에 20km가 한계였다면 배터리에 따라 40km 이상을 갈 수도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말로만 자연보호를 외쳤다면 셔틀 트럭 대신 전기
자전거로 매연을 줄일 수 있다. 외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 코스 적응을 위한 반복 훈련을 하기에 좋고, 앞서 얘기한 대로 알피엠에 기반한 지구력 훈련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eMTB를 일반MTB와 비교하며 폄하하는 짓은 그만하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변종이 아니다. 그냥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자전거일 뿐이다. 그것을 타고 달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editor 배경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