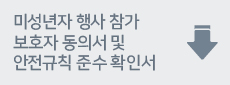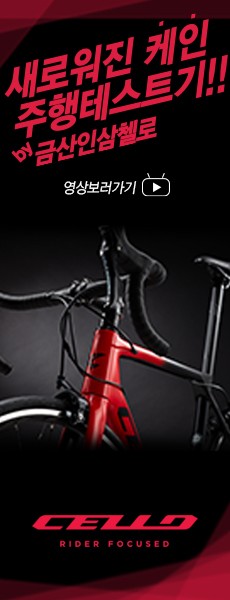칠곡 힐클라임 대회 후기 [낙동강 전선]
‘길’은 사람이 지나기 위해 땅에 낸 일정한 폭의 공간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길. 새벽 3시, 나는 아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 칠곡으로 향했다.
'길' 위에서 사람은 늘 선택한다. 오르막을 오를지, 돌아갈지, 멈출지.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쌓여 결국 ‘내가 걸어온 길’이 된다. 북수원 톨게이트를 지나자 경찰이 다리가 무너져 통과할 수 없다며 '길'을 막았다. 나는 곧장 방향을 틀어 의왕 톨게이트로 내려갔다. 조금 늦었을 뿐,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나는 고성, 용평, 무주, 여주, 양평, 익산을 지나 칠곡까지 달렸다. 강원도 DMZ 능선에서 낙동강까지 이어진 라이딩은 내 삶의 흐름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길'은 단순한 선이 아니다. 사람들이 남긴 시간이 층층이 겹쳐 있는 삶의 자리였다. 탁구에서 만난 인연들이 내 '길'에 얹혔고, 자전거로 만난 친구들의 '시간'이 그 위에 포개졌다. 고성을 달릴 때는 새로운 시간이 열렸고, 무주에서는 나제통문을 바라보며 신라와 백제 철의 발자취가, 미륵사지에서는 이순신의 기운이 오늘의 '길'과 스쳤다. 칠곡의 언덕에서는 과거의 숨결과 지금의 호흡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지게 부대원 7살 도용복은 두 동생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부동 전쟁터에서 탄약을 날랐다. 함께 걷던 친구 둘은 총탄에 쓰러졌다. 그는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다음 날 다시 지게를 졌다. 그 아이가 걸었던 그 길을 나는 자전거로 오르고 있다. 그 무게와 공포를 이 언덕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페달을 밟았지만 사실은 역사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 길이 나를 이끌었고, 지금도 내 삶은 그 흔적 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업힐을 만나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길이 아니라 나였다. 길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저 침묵 속에서 나를 비추어 줄 뿐이다. 내 체력과 속도, 지구력과 연약함이 그 속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왜 다시 '길'을 나설까. 왜 새벽에 일어나 먼 곳으로 달려가 힘든 오르막을 오를까. 답은 단순하다. '길' 위에서만 온전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 이유를 일깨운다.
안양에서 약목초등학교까지 242km를 달려 도착했다. 자전거를 내려 핸들바와 등판에 번호표를 달았다.운동장을 돌며 자전거를 점검했다. 상준이는 안장이 높아 조금 내렸다. 내 자전거 변속기는 대회 내내 말썽이었다.
오늘의 목표는 안전이었다. 나는 상준이 앞뒤에서 영상을 찍고 페이스를 맞추며 언덕을 함께 넘었다. 거리는 19.8km. 길지 않았지만 오르막은 만만치 않았다. 대형 덤프가 지나는 도로는 위험했고, 우리는 무리하지 않았다. 상준이는 완주했고 중고등부 4위를 차지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았다.
라이딩을 하며 나는 1950년 8월의 칠곡을 떠올렸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구멍. 나라가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가 이곳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갈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시작했다. T-34 전차를 앞세운 부대에 전차도 중화기도 없던 국군은 버틸 수 없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한 달 동안 전선 전체가 무너졌다. 북한군은 전국의 90%를 점령했고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다.
7월 말, 미군과 영국·호주 등 16개국이 참전했지만 전선 유지조차 힘겨웠다. 대한민국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다.
다부동, 왜관, 가산산성. 지금은 평범한 지명이지만 당시에는 매 순간이 생사의 경계였다. 포연이 팔공산에서 흘러내려 하늘을 뒤덮었고, 고지 하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을 바꾸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국군과 학도병은 시체를 방패삼아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절박함으로 마지막 힘까지 끌어냈다.
낙동강 건너 바람에는 총포 냄새와 8월 한여름의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섞였다. 왜관 철교는 폭파와 복구가 반복되었다. 강을 건너려는 북한군의 그림자가 밤마다 강 위에 드리웠다, 미군 포병의 굉음은 새벽마다 칠곡 들판을 흔들었다.
그들의 발자국과 피와 살 그리고 뼈가 이 흙 위에 남아 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청춘들의 마지막 숨결이 바람 속에 녹아 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잔잔한 바람과 고요한 산세, 아들과 나란히 달리며 지날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평화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버팀과 희생이 만들어 낸 시간의 선물이었다.
칠곡 배석재 힐클라임 대회는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전투를 떠올리게 했다.
언덕을 오르며 나는 과거의 절박한 시간이 오늘의 평화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생각했다. 바람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희생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났다.
우리가 업힐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는 이유도 같았다. 오르막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었다. 전쟁이 그들을 드러냈듯, 길은 나를 드러낸다.
역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다.내가 지금 밟고 있는 길 위에서 매 순간 새로 태어난다. 칠곡에서의 이 하루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누군가의 버팀으로 세워진 평화의 길을 오늘 나는 아들과 함께 달렸고 언덕을 올랐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라이딩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길' 위에서 사람은 늘 선택한다. 오르막을 오를지, 돌아갈지, 멈출지.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쌓여 결국 ‘내가 걸어온 길’이 된다. 북수원 톨게이트를 지나자 경찰이 다리가 무너져 통과할 수 없다며 '길'을 막았다. 나는 곧장 방향을 틀어 의왕 톨게이트로 내려갔다. 조금 늦었을 뿐,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나는 고성, 용평, 무주, 여주, 양평, 익산을 지나 칠곡까지 달렸다. 강원도 DMZ 능선에서 낙동강까지 이어진 라이딩은 내 삶의 흐름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길'은 단순한 선이 아니다. 사람들이 남긴 시간이 층층이 겹쳐 있는 삶의 자리였다. 탁구에서 만난 인연들이 내 '길'에 얹혔고, 자전거로 만난 친구들의 '시간'이 그 위에 포개졌다. 고성을 달릴 때는 새로운 시간이 열렸고, 무주에서는 나제통문을 바라보며 신라와 백제 철의 발자취가, 미륵사지에서는 이순신의 기운이 오늘의 '길'과 스쳤다. 칠곡의 언덕에서는 과거의 숨결과 지금의 호흡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
지게 부대원 7살 도용복은 두 동생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부동 전쟁터에서 탄약을 날랐다. 함께 걷던 친구 둘은 총탄에 쓰러졌다. 그는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다음 날 다시 지게를 졌다. 그 아이가 걸었던 그 길을 나는 자전거로 오르고 있다. 그 무게와 공포를 이 언덕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페달을 밟았지만 사실은 역사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 길이 나를 이끌었고, 지금도 내 삶은 그 흔적 위에서 이어지고 있다.
업힐을 만나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길이 아니라 나였다. 길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저 침묵 속에서 나를 비추어 줄 뿐이다. 내 체력과 속도, 지구력과 연약함이 그 속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왜 다시 '길'을 나설까. 왜 새벽에 일어나 먼 곳으로 달려가 힘든 오르막을 오를까. 답은 단순하다. '길' 위에서만 온전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존재 이유를 일깨운다.
안양에서 약목초등학교까지 242km를 달려 도착했다. 자전거를 내려 핸들바와 등판에 번호표를 달았다.운동장을 돌며 자전거를 점검했다. 상준이는 안장이 높아 조금 내렸다. 내 자전거 변속기는 대회 내내 말썽이었다.
오늘의 목표는 안전이었다. 나는 상준이 앞뒤에서 영상을 찍고 페이스를 맞추며 언덕을 함께 넘었다. 거리는 19.8km. 길지 않았지만 오르막은 만만치 않았다. 대형 덤프가 지나는 도로는 위험했고, 우리는 무리하지 않았다. 상준이는 완주했고 중고등부 4위를 차지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았다.
라이딩을 하며 나는 1950년 8월의 칠곡을 떠올렸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숨구멍. 나라가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서느냐가 이곳 칠곡 다부동 전투에서 갈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시작했다. T-34 전차를 앞세운 부대에 전차도 중화기도 없던 국군은 버틸 수 없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한 달 동안 전선 전체가 무너졌다. 북한군은 전국의 90%를 점령했고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다.
7월 말, 미군과 영국·호주 등 16개국이 참전했지만 전선 유지조차 힘겨웠다. 대한민국은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다.
다부동, 왜관, 가산산성. 지금은 평범한 지명이지만 당시에는 매 순간이 생사의 경계였다. 포연이 팔공산에서 흘러내려 하늘을 뒤덮었고, 고지 하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을 바꾸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국군과 학도병은 시체를 방패삼아 “여기서 물러나면 끝”이라는 절박함으로 마지막 힘까지 끌어냈다.
낙동강 건너 바람에는 총포 냄새와 8월 한여름의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섞였다. 왜관 철교는 폭파와 복구가 반복되었다. 강을 건너려는 북한군의 그림자가 밤마다 강 위에 드리웠다, 미군 포병의 굉음은 새벽마다 칠곡 들판을 흔들었다.
그들의 발자국과 피와 살 그리고 뼈가 이 흙 위에 남아 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청춘들의 마지막 숨결이 바람 속에 녹아 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잔잔한 바람과 고요한 산세, 아들과 나란히 달리며 지날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평화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절박한 버팀과 희생이 만들어 낸 시간의 선물이었다.
칠곡 배석재 힐클라임 대회는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다부동 전투를 떠올리게 했다.
언덕을 오르며 나는 과거의 절박한 시간이 오늘의 평화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생각했다. 바람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희생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났다.
우리가 업힐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는 이유도 같았다. 오르막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었다. 전쟁이 그들을 드러냈듯, 길은 나를 드러낸다.
역사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니다.내가 지금 밟고 있는 길 위에서 매 순간 새로 태어난다. 칠곡에서의 이 하루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누군가의 버팀으로 세워진 평화의 길을 오늘 나는 아들과 함께 달렸고 언덕을 올랐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라이딩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댓글을 작성 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